교각의 꼭대기는
안개에 가려
그 높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했다.
수많은 중장비들이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트럭보다도 훨씬 더 큰 트럭,
허벅지보다도 굵은
철사들과 나사들
한번도 본 적없는
물건들과 그 크기로
난 걸리버여행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며칠전 비가 와서인지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어
세 아이들은 웅덩이 사이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녔다.
이리로는 손을잡고
저리로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운동화에서 튀는 흙탕물이
팔꿈치와 얼굴까지 묻는게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고인 물을 피해
땅만 보며 뛴다고 뛰었지만
흡사 물장구치는 아이처럼
우린 마냥 즐거웠다.
------------------
순간이었다.
쿠쿠쿵!
갑작스런 충격과 힘에 떠밀려
웅덩이에 내동댕이쳐졌다.
멍하니 흙탕물에 입술을 적신 채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저만치 뿌연 흙먼지 사이로
수연과 슬기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
발파석 더미가 엊그제 내린 비로
무너져 내리며 우리를 덮쳐있었다.
울고있는 수연이의 하얀 드레스와 얼굴은
선홍빛 핏자욱이 선명했고
내 왼팔에서는 굵은 핏방울이
채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마냥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엎드린 채 기척이 없는 슬기의 하반신은
돌더미 아래 깔려 있었다.
몇몇 아저씨가 불어대는 호각 소리에
중장비들은 긴급히 움직임을 멈추었고
인부들이 소리치며
우리들 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아저씨들이
나와 수연이를 돌더미 밖으로 끌어내었고
슬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더욱 모여들면서
나는 사람들 사이로 이리저리 채이고 있었지만
차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수연과 쓰러져 있는 슬기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팔에 입은 상처는 금방 나았지만
흉터는 그렇지 않았다.
오랜동안 그 날의 악몽을 꾸며
아직도 피가 흐르는 듯
걷어올린 팔에는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덜 아문채 흉측한 흉터로 남아
원망하듯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았다.
슬기는 철로 만든 신발을
그 후로도 한참 신고 다녀야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철컥철컥하는 소리가와 함께
두 다리를 안쓰럽게 절었는데
아이들은 슬기를 향해
로보트, 다리병신이라 놀려댔고
사력을 다해 아이들을 혼내도 해보고
피터지게 싸워도 보았지만
우리에게 그해 가을은
상처로 남아버린
잔인한 계절로 뇌리에 각인되었다.
------------------------------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
슬기는 무거운 신발을 벗었음에도
마음의 짐까지는 벗지 못하고
개학과 동시에 전학을 갔다.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까지도
웃지 않는 슬기를 보며
죄책감으로
작은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모든 일이 나의 탓으로 느껴져
악수를 청하는 슬기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 볼 수 없었다.
끝내 터져버린 울음...
나보다 더 아프고 아파했을 슬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무력하고 한심해서
눈물을 훔치며
운동장을 달렸다.
시소곁 철봉에 매달려 울고 있는 나에게
수연이 다가왔다.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그 손길이
더욱 가슴이 아파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의 모자가 바람에 한들거리며
뺨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또 다른 깊은 상처가
눈물로 범벅이 되버린
나의 눈에 띄였고
기어코 나는 수연을
부둥켜안고
교문을 막 벗어난
슬기의 마지막 뒷모습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인사를 건넸다.
FIN
사진출처 두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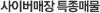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변하지 않은 풍경과 냄새...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블로그 만들고 부지런히 글을 올렸네요.
부족하지만 순수하게 읽어주시고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추천 주신분과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2000자